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삼성화재와의 일반보험 계약을 큰 폭으로 줄인 것은 악화된 실적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룹 계열사들의 실적이 정체되면서 ‘위기론’이 부상하자 보험계약 비용 관리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3분기 깜짝실적을 발표했지만, 스마트폰 부분의 수익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향후 좋은 실적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83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올해는 지난 3분기까지 1조5000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내며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계열사간 지원거래에 대한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점도 그룹 측면에선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계열사간 부당거래 논란을 피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얘기다.
이처럼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화재와의 거래를 줄이면서 빈자리는 외국계 보험사들이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올해 삼성화재와의 일반보험 계약을 줄이면서 나머지 물량은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월등한 대형 외국계 보험사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삼성화재는 계열사들의 물량 밀어주기 효과를 톡톡히 봤다.
삼성화재의 일반보험 가운데 계열사 매출 비중은 40%, 손익 기여도는 절반에 달한다. 특히 기업보험은 다른 보험들보다 수익성이 월등히 뛰어나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90%라면, 일반보험(화재보험 등 1년짜리 배상보험) 손해율은 통상 50~70%를 오간다.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남는것이 더 많은 상품이 일반보험이다.
하지만 이런 계열사간 보험계약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는 계열사간 거래를 줄이고 삼성화재 스스로의 이익 창출 능력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때 계열사 물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손해보험사 고유 업무인 일반보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당장은 실적이 줄겠지만 장기·자동차보험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손익규모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독] "고정금리 주담대 늘리려"…은행 새 자금조달 수단 나온다[한국형 新커버드본드]①](https://img.etoday.co.kr/crop/140/88/2213721.jpg)
![인도 18곳에 깃발…K-금융, 수출입 넘어 현지화로 판 키운다 [넥스트 인디아 下-②]](https://img.etoday.co.kr/crop/140/88/2270308.jpg)
![[AI 코인패밀리 만평] 커피값 또 오르겠네](https://img.etoday.co.kr/crop/140/88/227030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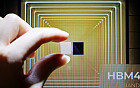
![캐즘 돌파구 대안으로…전기차 공백 메우기는 ‘한계’ [K배터리, ESS 갈림길]](https://img.etoday.co.kr/crop/140/88/2269002.jpg)





![2026년 원전 텐베거 잭팟주 후보! '이 주식'에서 노리세요! ㅣ 이영훈 iM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73yJ8EsmQdM/mqdefault.jpg)
![[종합] 코스피, 외국인 매도에도 4020선으로 상승 출발 흐름](https://img.etoday.co.kr/crop/85/60/2200367.jpg)

![[오늘의 핫이슈] 일본 12월 기준금리 결정](https://img.etoday.co.kr/crop/85/60/2270449.jpg)
![[글로벌 주요 증시 ] 美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마감](https://img.etoday.co.kr/crop/85/60/2270448.jpg)

![[채권전략]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환율 진정·저가매수 유입](https://img.etoday.co.kr/crop/85/60/2268059.jpg)



![[케팝참참] 공식 깨진 2025년 K팝…"신인이 주인공"](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70293.jpg)
!['통일교 특검'으로 뭉친 국민의힘-개혁신당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6953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