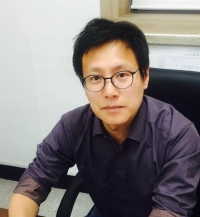
지금이라고 해서 저출산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2018년 이후 한국이 인구절벽에 도달한다는 예측도, 당장 병역 자원이 부족해 현역 판정비율을 높일 것이라는 국방부의 발표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가 진행된다. 이 추세라면 2050년엔 생산층 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2008년엔 6.8명이 부양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진다.
한국형 저출산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는 속도와 크기다. 고령사회로 이행하는 데 프랑스, 미국, 일본은 각각 115년, 72년, 24년 걸렸다. 우리는 18년이 걸렸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쏟아부은 자원이 얼마나 될지는 예측이 힘들다. 그러나 그 사이 합계 출산율은 1.297명에서 1.3명으로 0.003명 증가했다. 그나마 2014년엔 1.205명으로 다시 떨어졌다. 회복은 힘들지만 떨어지긴 쉽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많지 않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목소리에 비해 그에 맞는 변화는 미미하다.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내일은 위기의 연속이다. 당장 가장 빨리 변화해야 할 곳은 기업이다.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그 첫 번째다. 일을 잘 하기 위해 가정을 포기해야 하는 우리의 조직문화는 우리 사회에도, 일하는 사람의 성장에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니어가 주축이 되는 사회로의 변환을 준비하는 것이 두 번째다. 시니어의 욕구를 섬세하게 읽어내는 것은 물론, 노인은 물론 장애인 등 모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디자인해야 한다. 당장 저시력자가 읽을 수 없는 각종 홍보물과 제작물을 모두 바꾸는 것이 그 예다.
현재의 속도라면 산업구조 전반이 빠르게 바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잘 대응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받아볼 성적표는 생각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다.























![2월 둘째 주 유튜브 영상 순위 [이투PICK 순삭랭킹]](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78370.jpg)
!['설 연휴 귀성차량으로 막히는 고속도로'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9616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