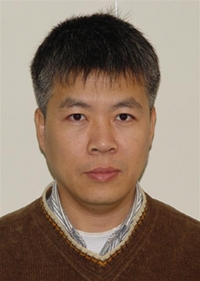
그 때 길옆에는 포도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넝쿨 밑으로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송이들은 너무 높이 달려 있었다.
펄쩍펄쩍 뛰어보았지만 역부족, 아무리 해도 따먹을 수가 없었다.
이 여우도 루저(loser)였나? 결국 포기하고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저것들은 무척이나 신포도(sour grapes)일 것이 분명해!’
내가 새로이 개발되는 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을 한 것은 작년 11월말이었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서 돌아보니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세련된 구조는 당장이라도 입주하고픈 충동을 느끼기에 충분한 흡입력을 갖고 있었다.
더군다나 그 아파트는 국내 유수의 건설사에서 짓는 브랜드파워를 갖고 있었고, 입주시점에는 지하철도 연장, 개통되는 등 나름대로의 많은 장점을 갖추고 있어 어느 정도의 당첨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아파트였다.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15년도 넘었거니와 용슬(容膝)조차 하기 힘든지라 망설이지 않고 청약을 했던 것이다.
청약신청 후 당첨자 발표일까지 거실은 어떻게 꾸밀 것이며, 한층 넓어질 것 같은 내방은 서재와 컴퍼넌트를 갖춰 지하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200여장도 더 되는 LP판에게 햇빛을 보게 해 주어야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렇지만 내가 좋으면 남들도 좋다던가?
수십대 1의 청약경쟁률은 애초에 나에게 당첨기회는 요원한 것이었나 보다.
당첨자 발표일, ARS를 통해 들려오는 낙첨소식에 나는 맥이 빠져버렸다.
그 때 애타게 당첨소식을 기다리던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당첨 안 됐어. 잘 됐지 뭐. 분양가도 너무 높고, 평당 1500만원이 뭐야? 지하철역도 10분은 더 걸어가야 되고...”
전화를 끊자 마자,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허청허청 걸어가는 여우와 내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자각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https://img.etoday.co.kr/crop/140/88/2293019.jpg)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https://img.etoday.co.kr/crop/140/88/2292951.jpg)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https://img.etoday.co.kr/crop/140/88/2292959.jpg)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https://img.etoday.co.kr/crop/140/88/2292831.jpg)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https://img.etoday.co.kr/crop/140/88/2229916.jpg)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https://img.etoday.co.kr/crop/140/88/2292971.jpg)









!['줄 안서도 됩니다' 오늘부터 로또 구매도 모바일로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85/60/2293409.jpg)





![[찐코노미] 엔비디아 '알파마요' 부상…테슬라 FSD 경쟁 구도에 변수](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93226.jpg)
!['줄 안서도 됩니다' 오늘부터 로또 구매도 모바일로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9340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