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머니의 깊은 자식 사랑과 그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히 녹아 있는 고(故) 김종철 시인의 ‘엄마 엄마 엄마’이다. 시 구절 구절이 가슴을 파고들어 너무나도 아프다.
지난주 시어머니께서 섧게도 이 세상을 떠나셨다. 삼베 수의에 싸인 어머니의 가슴을, 손을, 얼굴을 마지막으로 만지고 저세상으로 보내 드렸다. 거칠고 투박했지만 따뜻했던 손이 싸늘해 참 많이 울었다. 5년여 병상에 누워 계시는 동안 삶의 의지가 워낙 강했던지라 어머니께서 우리 곁을 떠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어멈! 짬뽕 먹으러 가자” 하며 벌떡 일어나실 것만 같았다. 그래서였을까, 눈감은 어머니를 보는데, 시집와 함께했던 20여 년의 세월이 한순간 버려진 것 같아 몹시 서러웠다.
“인생은 늘 이별이야. 만남은 이별을 위한 예행 연습이지. 이별을 위한 만남….” 선배의 말에 잠시 위로를 받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의 영원한 헤어짐은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다.
인간사 가장 원초적 문제가 삶과 죽음이듯 죽음을 뜻하는 우리말은 다양하다. 죽다, 숨지다, 삶(생)을 마감하다, 돌아가(시)다 등 직접적으로 죽음을 나타내는 말은 물론 사망, 타계, 별세, 서거, 사거, 운명(殞命), 작고, 영면, 붕어, 승하 등 한자어도 손에 꼽고도 남는다.
어디 이뿐인가. 종교에 따라서도 죽음을 표현하는 말은 갈린다. 불교에서는 승려가 사망하면 입적(入寂), 열반(涅槃), 입멸(入滅)이라는 말을 쓴다. 선종(善終)은 ‘선생복종(善生福終)’의 줄임말로, 사람이 죽는 것을 뜻하는 가톨릭의 공식 표현이다. 개신교의 ‘소천(召天)’은 ‘하늘의 부름을 받는다’는 뜻이다.
나는 죽음을 완곡하게 이르는 ‘눈감다’라는 표현을 주로 쓴다. 충격적이거나 좋지 않은 어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완곡어법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눈을 감다’와 ‘눈을 뜨다’는 우리 삶에 중요한 비유와 관용 표현이다. 누구나 하루를 눈을 뜨면서 시작하고 눈을 감으며 정리한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태어나 세상의 이치나 원리 등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눈을 떴다’고 말한다. 학문에 눈뜨고, 사랑에 눈뜨고, 현실에 눈뜨기도 한다. 그러다 어느 날 눈을 감은 후 다시 뜨지 못하면 세상과 이별한 것이다. 죽음을 뜻하는 ‘눈감다’와 깨우치다는 의미의 ‘눈뜨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세상을 떠나다/뜨다’ 역시 완곡어법에 해당한다. ‘떠나다/뜨다’는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떠난다는 뜻인데, ‘세상을 떠나다/뜨다’처럼 세상과 함께 쓰이면 ‘목숨이 끊어졌다’는 의미가 된다. ‘유명(幽明·어둠과 빛, 즉 저승과 이승)을 달리하다’, ‘불귀(不歸)의 객이 되다’, ‘황천 가다’ 등도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한 관용구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은 큰 행복이다. 뛰는 심장으로 하루를 열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새로운 아침이 왔다. 마치 선물처럼.
jsjysh@

![오늘부터 달라지는 청약통장…월 납입인정액 상향, 나에게 유리할까?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140/88/2096610.jpg)
!["한국엔 안 들어온다고?"…Z세대가 해외서 사오는 화장품의 정체 [솔드아웃]](https://img.etoday.co.kr/crop/140/88/2096654.jpg)




![LG전자 ‘아웃도어 2종 세트’와 함께 떠난 가을 캠핑…스탠바이미고‧엑스붐고 [써보니]](https://img.etoday.co.kr/crop/140/88/209647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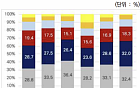



![2차전지 새로운 주도주 등장하나, 분야별 탑픽은 '이것' ㅣ 이창환 iM증권 영업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ZiFpzTXCCMY/mqdefault.jpg)








![[오늘의 주요공시] 에코프로, 3분기 영업손실 1087억…전년比 적자전환](https://img.etoday.co.kr/crop/85/60/2096708.jpg)
![[컬처콕 플러스] 아일릿, 논란 딛고 다시 직진할 수 있을까?](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95915.jpg)
![비트코인 4%대 하락... 7만달러선 붕괴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9669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