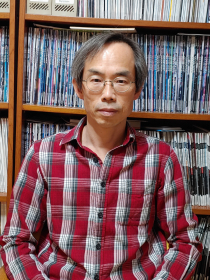
반면 올여름 최고 기온은 아직 평범한 편이다. 물론 지난 20년 평균값을 뜻하는 ‘예년 기온’보다는 높지만 1994년이나 2018년 같은 기록적인 수준은 아니다. 올여름 무더위의 특징은 하루 최저기온이 유난히 높다는 데 있다. 장마철 이후 무더위를 ‘찜통더위’라고 부르는데, 올해는 진짜 찜통의 상태에 더 가까워진 셈이다. 즉 고온다습에서 ‘다습(多濕)’의 영향력이 커졌다.
안 그래도 습한 공기가 올여름 더 습해진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1년 넘게 지구의 평균 해수면 온도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는 섭씨 30도 내외로 평년보다 2~3도나 높다.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에서 올라와 해가 진 뒤 지표의 열기가 빠져나가는 걸 막으면서(수증기는 강력한 온실기체다) 온도가 잘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가 이어지는 것이다.
무더위에 잠을 설치는 건 몸이 불편 또는 불쾌하다는 것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경고다. 즉 체온 조절이 잘 안 돼 자칫 심부 온도가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체온을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땀을 내는 것인데, 열대야에는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즉 땀으로 피부 표면에 나온 물분자가 증발할 때 뺏어가는 기화열(잠열)로 몸을 식히는데, 습도가 높으면 공기에서 피부로 오는 물분자도 많아(이때는 거꾸로 액화열이 들어와 몸을 덥힌다) 효과가 상쇄된다. 즉 땀이 나오자마자 증발해 사라지지 않고 피부에 물방울로 맺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땀’으로 존재한다. 땀이 나오자마자 증발하지 않고 땀방울로 떨어지면 체온을 낮추는 효과가 뚝 떨어진다.
그런데 최근 학술지 ‘사이언스’에는 무더위로 인한 사망에 습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리학자와 역학자(疫學者)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뜻밖의 뉴스가 실렸다. 생리학자 진영은 습도가 땀에 의한 체온 조절 효율을 좌우하므로 당연히 온열질환 사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지만(필자도 이쪽이다), 역학자 진영의 입장은 막상 현장 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면 온도 자체가 변수일 뿐 습도는 영향이 없거나 있어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습도가 높으면 불쾌함이 커지겠지만 사망률은 다른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열린 극한 더위 워크숍에 모인 과학자들은 이 모순을 설명하는 몇 가지 가정을 제시했다. 먼저 온열질환 사망자 데이터 대다수가 중위도 선진국에서 수집된 것으로, 정작 습도의 영향이 치명적인 저위도 지역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선진국 사람 대다수는 냉방이 되는 실내에서 정적인 생활을 하므로 기후의 영향을 덜 받는다. 그 결과 이 지역 온열질환 사망자 대다수는 노인인데, 나이가 들수록 땀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습도의 영향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결국 이런 요인들이 합쳐져 ‘습도가 높으면 온열질환 위험도 커진다’는 과학상식이 역학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록적인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온열질환자가 20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20명에 이르고 있다. 참고로 온열질환 사망자는 역대 두 번째로 더웠던 1994년 9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더웠던 2018년은 48명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두 해의 열대야 일수는 비슷했다. 24년 사이 에어컨이 많이 보급된 게 사망자가 준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역학조사를 해도 습도의 영향이 미미하게 나오지 않을까.
기후변화로 여름철 습도가 심해지면서 이제 에어컨은 생존장비가 된 느낌이다. 전력 위기가 오지 않게 냉방장치를 절제하며 쓰는 지혜를 발휘해야겠다.





















![[내일 날씨] 이어지는 강추위 최저기온 영하 15도⋯큰 일교차 주의](https://img.etoday.co.kr/crop/85/60/2289560.jpg)
![키키도 소환한 그 감성⋯Y2K, 왜 아직도 먹히냐면요 [솔드아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92619.jpg)
![주말 '냉동고 한파'... 추위 월요일까지 이어져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9282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