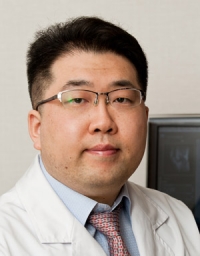
나는 오늘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 그런 면에서 평범하지만 나름 괜찮은 가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에는 변함없이 꿈틀대는 소설가의 꿈이 있다. 이건 결국 꿈에 불과한 걸까.
40명이 넘는 입원환자와 100명 가까이 되는 외래환자를 돌보고 나면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힘겹다.
환자들은 모두 부모 형제 같다.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간단한 수술이라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하지만, 중요한 것은 환자들의 생활이다. 얼마만큼 편하게 해줄 수 있느냐의 여부가 내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간단한 수술이든 큰 수술이든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결국 내 생활은 극도의 긴장감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면 사랑하는 아들이 기다리고 있다. 너무도 귀여운 아들이 반갑게 맞아 주면서 “아빠 치킨 사주세요”, “로봇도 사주세요”라고 말한다. 그게 인사다. 그래도 귀엽다. 사내아이인지라 노는 것도 격렬하다. 총싸움을 하고 공놀이를 하며 함께 놀아줘야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빠이기 때문에 놀아줘야 하지만 몸은 자꾸만 소파를 찾아간다. 주말이면 하루쯤 푹 쉬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다. 아내와 함께 마트도 가야하고 아이와 함께 외식도 해야 한다. ‘자상한 아빠(남편)’라는 굴레와도 같은 타이틀을 지켜내려면 어쩔 수 없다
내 평범한 일상은 이렇다. 그러나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 꿈은 희미해져간다. 오늘도 소설가의 꿈은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꿈은 저버리고 싶지 않다. 올해는 반드시 소설을 쓰고 싶다. 제목을 정한지 3년이나 지났고, 대략적인 줄거리도 정해졌다. 더 이상 미뤄야할 이유가 없다. 난 평범한 아빠(남편)지만 소설가 지망생이기도 하다.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https://img.etoday.co.kr/crop/140/88/2258651.jpg)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140/88/2294883.jpg)

![또 소환된 2018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 [2026 동계올림픽]](https://img.etoday.co.kr/crop/140/88/2294877.jpg)






!["엔비디아가 골목길 입구까지 쫓아왔다?" 자율주행 사이다 팩트 체크 [찐코노미] #테슬라](https://i.ytimg.com/vi/tIWc3d9GgOE/mqdefault.jpg)

![예상보다 강한 美 고용 지표 발표에도 상승…금 선물 1.51%↑ [뉴욕금값]](https://img.etoday.co.kr/crop/85/60/2285297.jpg)


![뉴욕증시, 약보합 마감⋯‘강한 고용’에 금리인하 기대 뒷걸음[상보]](https://img.etoday.co.kr/crop/85/60/2295043.jpg)
![종목별 기업 실적 엇갈리며 혼조 마감…스톡스600 0.10%↑ [유럽증시]](https://img.etoday.co.kr/crop/85/60/2295044.jpg)
![[오늘의 청약 일정] ‘광명퍼스트스위첸’ 청약 접수 등](https://img.etoday.co.kr/crop/85/60/2294918.jpg)
![최가온·이채운 결선행…오늘(12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https://img.etoday.co.kr/crop/85/60/2295041.jpg)
![[오늘의 IR] 이마트ㆍ두산에너빌리티ㆍ뉴로핏 등](https://img.etoday.co.kr/crop/85/60/2285973.jpg)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94883.jpg)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9493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