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점원 2명이 고객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 속의 여성 고객은 다리를 꼬고 앉아 “둘 다 똑바로 해. 지나가다 마주치면 죄송하다고 해”라며 점원을 다그치는데요. 점원들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무릎을 꿇고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합니다.
이 고객은 귀금속 무상 수리를 요구하다 거절당한 것에 불만을 느끼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부천의 한 대형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모녀 고객이 아르바이트 주차요원에게 무릎을 꿇리고 폭언을 한 일도 있었죠. 땅콩회항부터 인분교수, 라면상무까지 그야말로 ‘갑질 한국’입니다.
끊이지 않는 갑질 논란, 이유가 뭘까요. 우선 갑질의 사전적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갑질이란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甲)이 권리관계에 있는 을(乙)에게 부리는 부당행위를 말합니다.
‘자신이 잘난 줄 안다’, ‘손윗사람에게도 반말 한다’, ‘배경 설명 없이 무조건 따르기만을 강요한다’, ‘조직의 힘과 개인 역량을 혼동한다’ 등이 갑질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들이죠.
갑질은 역사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조선은 양반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양반의 혈통인지, 노비의 핏줄인지가 중요했죠. 1894년 갑오개혁으로 반상제도는 철폐됐지만 500년간 뼛속 깊이 녹아든 ‘양반 의식’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대평가 중심의 교육제도도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학생들의 개성은 무시하고 점수와 등수만으로 서열을 매기는 문화가 사회로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갑과 을을 만들어 내는 거죠. 전교 1~20등 학생들에게 먼저 밥을 주고, 우등 반에만 에어컨을 틀어준다는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1등만 인정받는’ 교육제도가 낳은 폐단들입니다.

무엇보다 소득 불평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소득 상위 10%의 가처분소득은 1억100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대로 하위 10%는 435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가처분소득이란 개인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가처분소득이 많으면 소비도 늘어나죠. 조사 결과로 보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쓸 돈이 25.3배나 많은 겁니다.
이같은 불평등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자신을 을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난 갑이다’ 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도 채 안된다고 하네요. 최근 온라인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금수저, 흙수저, 개룡품절(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지났다란 뜻), 헬조선 등의 신조어들을 보면 우리사회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껴집니다.
작가 겸 방송인인 유병재씨가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굽실대지 않는 사람들을 불친절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갑질은 내가 하는 것이었다”란 글을 남겨 화제를 모았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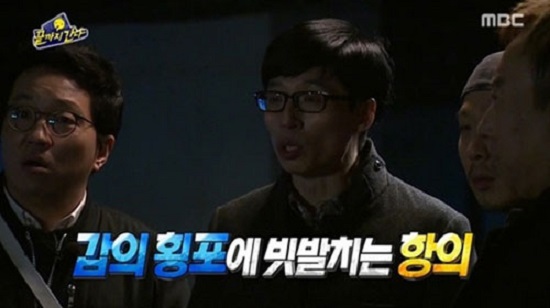


![반도체 이어 ‘원전·방산·이차전지’ 랠리⋯순환매로 넓어지는 상승장 [육천피 시대 개장]](https://img.etoday.co.kr/crop/140/88/2299725.jpg)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매파 금통위와 채권시장 달래기](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1985.jpg)
![트럼프 “대부분 국가 무역합의 유지 원해⋯관세 유지될 것” [상보]](https://img.etoday.co.kr/crop/140/88/2299804.jpg)








![장중 사상 첫 '육천피' 돌파한 코스피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85/60/2299716.jpg)
!["현대차 저평가 끝?"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변수 [찐코노미]](https://img.etoday.co.kr/crop/85/60/2299681.jpg)
!["다같이 단종 안아"⋯'왕사남', 과몰입 비결 탈탈 털어보니 [엔터로그]](https://img.etoday.co.kr/crop/85/60/2299262.jpg)
![코스피 6000 목전... 20만전자·100만닉스 달성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85/60/2299306.jpg)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2월 국내 배당주 정리 [그래픽 스토리]](https://img.etoday.co.kr/crop/85/60/2299248.jpg)
!["군 투입이 곧 폭동?"…내란죄 성립 두고 격돌 [정치대학]](https://img.etoday.co.kr/crop/85/60/2298734.jpg)
![2030 차 안 산다…신차 구매 비중 10년 새 '최저'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85/60/2298694.jpg)
!["부럽고도 싫은 한국"…동남아 불매운동 이면 [해시태그]](https://img.etoday.co.kr/crop/85/60/2298672.jpg)
!["나는 AI 시대에 안 맞는다" 잘나가던 CEO의 자진 하차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85/60/2298655.jpg)
![현대차, 자동차 아니다…로봇이 새 주가 모멘텀 [찐코노미]](https://img.etoday.co.kr/crop/85/60/2298408.jpg)
!["현대차 저평가 끝?"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변수 [찐코노미]](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99681.jpg)
![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간담회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9978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