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과 소셜 공간은 ‘레거시(Legacy)’로 불리는 기존 언론에 있어 중요한 공간임은 틀림없다. 신문이나 방송이나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모두 ‘디지털 퍼스트’ ‘모바일 퍼스트’에 매달리고 있다. 담당 인력을 두어 온라인 목 좋은 곳에 기사를 배치해 보기도 하고, 편집을 바꿔보기도 한다. 소셜 계정을 통해 기사를 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쉽게 클릭이나 공유를 유발하지 못한다.
왜일까. 독자들의 시간을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급자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언론재단에서 번역, 출간한 책 <디지털 뉴스의 혁신(지은이 루시 퀑, 옮긴이 한운희ㆍ나윤희)>에는 이를 혁신적으로 돌파한 쿼츠(Quartz)를 비롯, 가디언과 뉴욕타임스, 버즈피드, 바이스미디어 다섯 곳의 혁신 수행의 과정과 사례를 잘 담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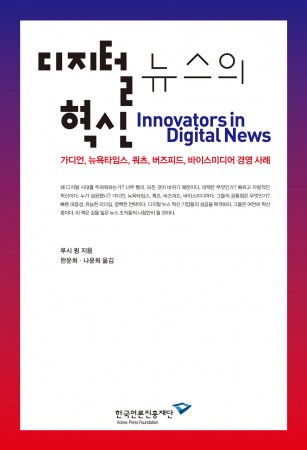
책에 따르면 쿼츠는 독자들이 가볍고 짧은 콘텐츠만을 소비하려 한다는 것도 일종의 편견이라고 봤다. 독자들, 특히 ‘영리하고 젊지만 직장에서는 지루해하는 사람들’, 이른바 SYBW(Smart, young, and bored at work)들은 깊이있고 통찰력을 주는 콘텐츠라면 길거나 짧거나 기꺼이 소비하려는 태도가 갖춰져 있다는 것.
유서깊은 미국의 애틀랜틱미디어컴퍼니(The Atlantic Media Company)는 지난 2009년 미래 전략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기존 미디어를 없애거나 바꾸는 것보다 새로운 스타트업 미디어를 창간하는 것을 택했다. 그렇게 논의되기 시작해 2012년 9월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쿼츠다.
쿼츠는 뉴스 소비는 ‘풀’(독자가 사이트를 방문해 소비하는 방식)에서 ‘푸시’(새로운 기사가 소셜 미디어나 모바일 알림으로 독자를 찾아가는 방식)로 이동했고, SYBW이 뉴스를 소비하는 소셜 스트림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고 봤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조 중 하나로 “독자의 시간을 존중하라”를 택했다. 시간은 매우 부족한 자원이 됐으니 당연한 명제인데, 많은 언론사들이 이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쿼츠의 기사는 매우 짧다. 300~600단어 정도. 물론 1000단어 이상의 긴 기사도 허용한다. 하지만 의도가 명확해야 한다. 독자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각적인 요소를 가미한다. 그렇다면 공유를 유도할 만큼 매력적인 헤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
지난 2013년 실렸던 ‘미국 참치 중 59%는 진짜 참치가 아니다’란 기사가 전형적인 예(http://qz.com/55699/59-percent-of-americas-tuna-isnt-actually-tuna/). 짧지만 사진과 그래픽 등을 이용해 가치있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소셜 웹에서 정말 퍼지는 스토리가 되었다.
물론 쿼츠도 이제 스타트업을 막 벗어난 상태. 규모를 키워야 하는 고민을 갖고 있다.
버즈피드는 어떤가. 5장에 실린 버즈피드 이야기의 제목은 ‘지루한 직장 생활을 버티는 수많은 회사원들의 삶을 재미있게 하기’이다.
창업자 조나 페리티가 아무리 허핑턴포스트 등을 거치며 ‘콘텐츠 바이럴의 왕’의 위치에 있었다고 해도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시도는 아니었다. 페리티는 저널리스트도 아니었고 사업가도 아니었다. 다만 MIT 미디어랩을 졸업한 그는 기술에 능했고 ‘전염성 있는 미디어’를 오랫동안 실험해 왔으며 뛰어난 직관의 소유자였다.
그는 “구전이 배포 그 자체”라고 봤고 그것은 버즈피드의 생명력이 되었다. 너무 흔해진 리스티클, 인터랙티브 퀴즈 등은 버즈피드로부터 유래됐다.
버즈피드는 내친김에 탐사보도까지 하겠다고 한다. 저자는 허황된 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장래를 생각해 볼 때 버즈피드는 종이신문의 쇠락에 따른 진공상태를 채워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진지한 뉴스와 라이프스타일 콘텐츠의 결합은 그 어떤 충돌도 일어나지 않을뿐더러 뉴스의 질도 떨어트리지 않는다.”고 했다. 버즈피드도 “우리는 정치에 관해 매우 진지한 기사를 쓸 수 있고 퍼거슨 폭동에 대해 쓸 수도 있다. 그런 분야의 속보도 매우 진지하게 내보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
어떻게 가능하다고 하는 지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으면 많이 얻을 수 있다. 저자 루시 퀑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RISJ) 전문연구원이며, 부부가 공동 번역했다. 한운희씨는 연합뉴스 미디어랩 기자이며 나윤희씨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 통번역사다.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https://img.etoday.co.kr/crop/140/88/2296827.jpg)


![BTS 해외 팬 10명 중 9명 "덕질하려고 한국어 배워"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140/88/2297314.jpg)
!['낼기' 붐 온다더니⋯차트가 증명한 하우스의 매력 [엔터로그]](https://img.etoday.co.kr/crop/140/88/2297309.jpg)









![[내일 날씨] 낮 최고 16도 '포근'…아침엔 영하권, 큰 일교차 주의](https://img.etoday.co.kr/crop/85/60/2295732.jpg)






!['낼기' 붐 온다더니⋯차트가 증명한 하우스의 매력 [엔터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97309.jpg)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9736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