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는 통상 경기에 6개월가량 후행하는 지표다. 지금 바닥을 찍었어도 고용이 살아나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 실업 한파’가 우려할 만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수는 18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000명(34%) 증가했다. 8월의 6개월 이상 실업자 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1999년 8월 27만4000명을 기록한 이후 8월 기준으로 최대치다.
장기실업자 수는 2013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4년 이후에는 매달 평균적으로 1만∼2만여 명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올해 초까지 증가 폭이 3만∼4만여 명으로 확대됐고, 지난 7월 5만1000명으로 급등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증가 폭이 6만 명대로 늘었다.
전체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전체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 비율은 18.27%로 1999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1999년 당시 20%에 달했던 장기실업자 비율은 이후 꾸준히 하락해 2010년 이후에는 7∼8% 선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장기실업자가 늘면서 장기실업 비중은 10%대로 올라선 데 이어 올해 7월에는 10% 후반대까지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단기 실업은 구직과정이나 경기침체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경제현상이지만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실업자들이 구직에 잇따라 실패해 발생하는 장기실업은 일반적으로 경기 이상 징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선ㆍ해운 산업 구조조정으로 본격적인 대량 실업이 시작되면 ‘고용 쇼크’가 재연될 소지가 있는 까닭이다.
외환위기 당시 고용시장은 ‘단기붕괴’였다. 불과 1년 사이 실업률은 2% 내외에서 8.8%까지 수직 상승했다. 산업 전반으로 확산된 고용 악화는 전 산업 분야에서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 1년 이상 오래 걸렸다.
20~30대 고용사정이 더 안 좋다는 것도 외환위기를 빼닮았다. 8월 청년실업률은 9.3%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포인트나 뛰었다. 8월 기준으로는 1999년 8월(10.7%) 이래 최고치다.
외환위기 당시엔 정규직 등 하위직부터 해고가 이뤄졌다면, 현재는 비정규직 등 임시·일용직과 한계 자영업자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장기실업자의 증가세는 이미 한국경제가 장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분석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금융학회장)는 “경제 활력이나 일자리 상황만 보면 기업부도나 대량실업 증가 등 위기 도미노가 우려된다”며 “기업의 해고 여건은 그 당시와 비슷해졌는데 2000년대 이후 법원의 태도가 달라져 통합도산법에 따른 채무자 회생 등 사회안전망은 그때보다 오히려 후퇴한 면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 교수는 “이미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연장을 안 하는 방식으로 해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IMF 때도 경제위기 징후는 몇 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내년 대선 말께 위기가 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단독] "고정금리 주담대 늘리려"…은행 새 자금조달 수단 나온다[한국형 新커버드본드]①](https://img.etoday.co.kr/crop/140/88/2213721.jpg)
![인도 18곳에 깃발…K-금융, 수출입 넘어 현지화로 판 키운다 [넥스트 인디아 下-②]](https://img.etoday.co.kr/crop/140/88/2270308.jpg)
![[AI 코인패밀리 만평] 커피값 또 오르겠네](https://img.etoday.co.kr/crop/140/88/227030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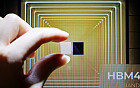
![캐즘 돌파구 대안으로…전기차 공백 메우기는 ‘한계’ [K배터리, ESS 갈림길]](https://img.etoday.co.kr/crop/140/88/2269002.jpg)





![2026년 원전 텐베거 잭팟주 후보! '이 주식'에서 노리세요! ㅣ 이영훈 iM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73yJ8EsmQdM/mqdefault.jpg)
![송미령 장관 “계란, 식품·바이오 잇는 산업 플랫폼으로 성장” [2025 에그테크]](https://img.etoday.co.kr/crop/85/60/2270549.jpg)


![김창길 에그테크코리아 2025 대회위원장 “계란 통해 농업 전환의 미래 설계할 것” [2025 에그테크]](https://img.etoday.co.kr/crop/85/60/2270548.jpg)





![[케팝참참] 공식 깨진 2025년 K팝…"신인이 주인공"](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70293.jpg)
![에그테크 코리아 2025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7053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