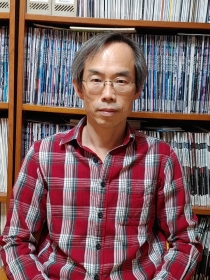
고고학 유물에 따르면 인류는 1만여 년 전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술 빚는 법을 터득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효모(이스트) 발효만으로 만들 수 있는 과일주나 꿀술이었고, 그 뒤 맥주처럼 다소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술을 빚었다. 그리고 중세시대 증류법을 발명해 도수가 높은 증류주를 만들게 됐다. 호모 사피엔스 30만 년 역사에서 술맛을 알게 된 건 이처럼 비교적 최근의 일인 걸까.
지난달 영국 학술지 ‘왕립학회열린과학’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우리가 반주를 즐기는 취향을 얻게 된 건 이보다 훨씬 오래전 일인 것 같다. 우리와 수천만 년 전 갈라진 검은손거미원숭이도 반주를 즐기기 때문이다. 중미 파나마에 서식하는 이 원숭이는 주로 열매를 먹고 사는데, 특히 호보나무의 잘 익은 열매를 좋아한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의 인류학자들이 원숭이가 먹다 떨어뜨린 열매를 주워 성분을 분석한 결과 에탄올 함량이 1~2%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열매가 익으며 벌어진 곳에 효모 포자가 내려앉으면 발효가 일어나 과육에 에탄올이 들어 있다. 즙을 짜면 바로 과실주다. 건더기를 밥이라고 치면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는 셈이다. 약간 비위가 상하는 상상이지만 전형적인 반주 분량인 맥주 한두 잔에 밥과 국, 반찬을 말면 에탄올 함량이 얼추 원숭이가 먹는 열매와 비슷할 것이다. 그런데 원숭이는 사람과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에탄올이 들어 있는 열매를 먹는 것 아닐까.

2019년 스웨덴과 멕시코의 과학자들은 검은손거미원숭이가 정말 반주를 즐기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했다. 설탕물에 에탄올을 탄 뒤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그냥 설탕물보다 에탄올이 포함된 설탕물을 더 좋아했고 그 한계는 3%였다. 역시 반주 범위의 양이다.
흥미롭게도 이들의 반주 취향은 몸이 받쳐준 결과다. 즉 야생에 사는 검은손거미원숭이의 소변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시료 6개 가운데 5개에서 에탄올 대사산물인 에틸글루쿠로나이드와 에틸설페이트가 검출됐다. 이들의 몸에 에탄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갖춰져 있다는 말이다. 독성이 있는 에탄올이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으면 호흡이나 배설로 빠져나갈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
대사 과정을 보면 먼저 알코올탈수소효소(ADH)가 에탄올을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꾸고 다음으로 알데히드 가수분해효소(ALDH)가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아세테이트로 바꾼다. 포유류의 게놈에는 이들 효소의 유전자가 들어 있다. 초기 포유류의 먹이 가운데 에탄올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에 대응한 진화의 결과다.
2020년 캐나다 과학자들은 포유류 85종의 ADH 효소 유전자를 분석해 변이를 살펴봤다. 그 결과 대형 유인원 가운데 고릴라, 침팬지, 사람은 유전자 변이로 효소 활성이 40배나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흥미롭게도 박쥐 가운데서 주로 과일을 먹는 종들에서 유전자에 똑같은 변이가 일어났다. 이처럼 분류학 관점에서는 서로 먼 사이지만 비슷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같은 방향으로 바뀐 경우를 ‘수렴진화’라고 부른다.
한편 육식동물이나 풀을 뜯어 먹는 소나 말 같은 초식동물로 진화한 경우 열매를 먹지 않고, 따라서 에탄올을 대사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어느 순간 ADH 유전자가 고장 나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는 에탄올을 제대로 대사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참고로 개는 잡식동물이지만 그 조상인 늑대는 육식동물이다.
물론 사람도 개인에 따라 에탄올을 대사하는 능력에 차이가 크다. 이는 주로 대사의 두 번째 단계, 즉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아세테이트로 바꾸는 효소인 ALDH의 변이 때문이다. 지구촌 인구 가운데 8%만이 변이형을 지니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동아시아인에 몰려 30%에 이른다. 술을 마시면 얼굴이 벌게지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반주로 섭취하는 양은 별문제가 없다. 다만 부모 양쪽에서 변이형을 받은 사람들(동아시아인의 2%)은 술 한 잔도 위험하다(아세트알데하이드도 독성이 큰 물질이다).
한참 술 얘기를 하다 보니 오늘 저녁에는 비록 집밥을 먹겠지만 반주 한잔을 걸쳐야겠다.















![송파구, 리센츠 47억·잠실엘스 46억 [올해 최고가 아파트]](https://img.etoday.co.kr/crop/85/60/2296038.jpg)


![밥상의 온기와 인간 중심 서사로 관객 사로잡은 ‘왕과 사는 남자’[리뷰]](https://img.etoday.co.kr/crop/85/60/2295902.jpg)

![[인터뷰]"해양수도 부산의 심장, 강서를 다시 세우겠습니다"](https://img.etoday.co.kr/crop/85/60/2296615.jpg)

!['설 연휴 귀성차량으로 막히는 고속도로'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85/60/2296167.jpg)
![2월 둘째 주 유튜브 영상 순위 [이투PICK 순삭랭킹]](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78370.jpg)
!['설 연휴 귀성차량으로 막히는 고속도로'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9616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