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정치권, 학계, 일반 유권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해 당사자들 간 갈등이 합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선거제도를 받쳐주는 원칙들이 서로 충돌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의 민주주의 국가 선거제도의 비례성 원칙과 책임성 원칙은 양립하기 어렵다.
비례성 원칙은 유권자들이 후보 혹은 정당을 선택한 비율만큼 국회의원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이 전국 단위에서 총 20%에 달하는 유권자들의 표를 확보했다면, 그 정당은 전체 국회 의석 중 2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비례성 원리에 충실한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제다. 그런데 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채택한 소선거구제에서는 비례성 원칙이 깨지기 쉽다. 소선거구제에서는 각 지역구에서 1등을 차지한 후보만 국회에 진입할 수 있다. 만약 100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특정 정당의 후보들이 모두 자신의 지역구에서 40%의 득표율로 2등을 했다면, 그 정당은 전국 단위에서 총 40%의 유권자의 표심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배출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책임성 원칙은 선출직 공무원이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소선거구 제도에서 잘 지켜진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을 보고 투표하고, 선출된 후보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선거에서 재차 지지할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민심을 확보하기 위해 민의의 대리자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유권자가 특정 후보 대신 정당을 선택하게 하여 비례성을 확보하는 비례대표제에서는 책임성 원칙이 어느 정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3번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유권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렇듯 비례성과 책임성의 원칙은 서로 상충하는 경향을 보인다. 비례성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순수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유권자와 선출직 정치인 간 괴리가 커지는 부작용이 생긴다. 반면 책임성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지역구에서만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비례성이 깨질지도 모른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두 원칙을 절충하는 선거제도가 활용된다.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병립형 제도에서는 일부 의석은 지역 소선거구에서 직접 후보를 선출하여 채우고, 나머지 의석은 정당 투표율에 따라 배분하여 비례성을 보완한다. 비례대표제에서도 유권자가 정당만 선택할 수 있는 폐쇄형 명부제 대신, 지지 정당에서 내세운 후보들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개방형 명부제에서는 책임성 보완이 가능하다. 지난 제21대 총선에 적용된 연동형 제도 역시 원래 지역구 대표를 뽑기 위해 던진 표의 비율에 준해 의석 배분을 조정하여, 책임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다.
비례성과 책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과정에서 선거제도는 복잡해진다. 여러 선거제도들의 장단점을 따지기 위해 복잡한 수식이 동원되기도 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시뮬레이션하기도 한다. 이러한 작업을 일반 유권자가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되면 될수록 일반 유권자들이 소외되는 경향이 생긴다. 국회의원 개인은 재선이라는 목표 때문에 복잡한 선거제도의 내용을 꼼꼼히 따진다. 정당은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는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선거제도의 이모저모를 철저하게 검토한다.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론적 차원에서 여러 선거제도의 장단점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반 유권자의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유권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선거제도가 무슨 소용인가? 유권자에게 여러 선거제도의 장단점을 잘 이해시킨 후 선호를 묻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체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인가?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https://img.etoday.co.kr/crop/140/88/2270227.jpg)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https://img.etoday.co.kr/crop/140/88/208234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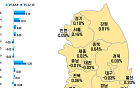




![2026년 원전 텐베거 잭팟주 후보! '이 주식'에서 노리세요! ㅣ 이영훈 iM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73yJ8EsmQdM/mqdefault.jpg)



![[종합] 뉴욕증시, CPI 둔화·AI 저가매수에 기지개…나스닥 1.38%↑](https://img.etoday.co.kr/crop/85/60/2267286.jpg)


![[상보] 국제유가, 러·베네수엘라발 공급 불확실성에 상승…WTI 0.38%↑](https://img.etoday.co.kr/crop/85/60/2268616.jpg)
![캐즘 돌파구 대안으로…전기차 공백 메우기는 ‘한계’ [K배터리, ESS 갈림길]](https://img.etoday.co.kr/crop/85/60/2269002.jpg)
![포드도 뛰어든 패권다툼…성장 기대 속 출혈경쟁 우려 [K배터리, ESS 갈림길]](https://img.etoday.co.kr/crop/85/60/2268943.jpg)

![[케팝참참] 공식 깨진 2025년 K팝…"신인이 주인공"](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70293.jpg)
!['통일교 특검'으로 뭉친 국민의힘-개혁신당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6953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