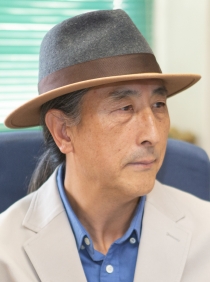
세상 모든 이야기의 근원을 따져보면 ‘있었던(일어난) 일’, 즉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하거나,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일어날 법한 일’을 다루는 순수 허구의 산물, 혹은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공상의 산물 중 하나다. 물론 역사에 허구를 가미하거나, 허구적 산물이지만 시대나 역사를 배경에 삽화적으로 내포하는 경우 등, 여러 혼합 형태도 얼마든 가능하니 세상은 온통 이야기로 충만해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 허구적 상상력을 이야기로 펼쳐내는 가운데 지금 우리 곁에 실재하는 것을 반영하거나, 지나간 역사 속 인물이나 사건을 내포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겉 이야기와 속 이야기라고 하는 중층구조(심연구조)를 만들어내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양자 사이의 유사성과 대조, 그리고 긴장과 길항(拮抗)이 알레고리(allegory)의 기본이다. 알레고리는 감춰져 있는 것이고,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언뜻언뜻 제시되는 틈새(균열)를 통해 수용자에게 비유적으로 전달된다.
수용자가 그것을 받아 겉 이야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는 심층 의미에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독할 수 있을 때, 이야기 텍스트는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야기꾼은 텍스트의 구성자이며 온갖 재료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해 놓는 사람이다. 창작자가 차려놓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텍스트를 궁극적으로 완성하는 주체는 수용자라고 하는 관념은 후기구조주의를 넘어 오늘날의 인지주의 문예이론과 비평 담론에서 한결같이 주장하는 바다. 텍스트에 대한 수용자의 ‘해석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영화 ‘파묘’가 800만을 넘어 1000만 가도를 향해 질주 중이다. 전 세계 133개국에 판매됐으며, 이미 개봉한 몇몇 나라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 사이 우리 사회에서도 이 영화를 둘러싼 온갖 담론과 가십이 넘쳐나며 신드롬을 형성해 가고 있다. 관객의 해석적 협력이 이처럼 뜨거워지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 된다.
이 글을 통해 짧게나마 장재현 감독을 칭찬하고 싶다. 그가 가진 가장 큰 미덕은 농경적 근면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 영화를 위해 우리의 무속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로 나아가기 위한 공부를 했다.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일본사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췄다. 음양오행에 입각한 풍수사상, 풍수사(지관)의 전문성에 대한 탐색과 취재,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제로 현업에서 1년 이상 활동하며 경험을 축적했다.
나아가 일제 강점 시기 일본의 민속학자로 ‘조선의 귀신’ ‘조선의 풍수’ ‘조선인의 생로병사’와 같은 저서를 발간하며 식민지 정책을 지원했던 ‘무라야마 지준’에 대한 공부 등등, 다방면에 걸쳐 그의 공부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루어졌는지 작품 속 도처에 심겨 있고,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코드들이 그의 내공을 알려준다. 특히 일본의 조선 침략과 우리의 힘을 빼고자 하는 야욕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끈질기게 이어져 왔는지를 직접적이면서도 상징적으로 심어놓은 것은 위대한 상상력이다.
‘파묘’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제안하는 바는 잘못된 과거사를 파헤쳐 제대로 바로잡고, 털어내고 마무리하자는 제안이다. 한 편의 상업영화가 이뤄낼 수 있는 표면적 오락성도 훌륭하지만, 도처에 숨겨놓은 알레고리를 파헤쳐 해독하고 이야기를 완성하는 재미를 동시에 충족해주는 특별한 작품이다. 고전의 반열에 들 만한 필요충분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2월 둘째 주 유튜브 영상 순위 [이투PICK 순삭랭킹]](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78370.jpg)
![중국 춘절 연휴 시작, 북적이는 명동거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9628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