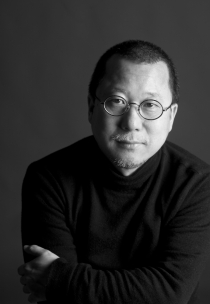
소설 즈음은 신춘문예 공모 준비에 한창일 때. 시립도서관 참고열람실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봄여름 가을 내내 책이나 읽다가 일간지 신춘문예에 공모기사가 뜨면 마음이 분주해진다. 일간지 신춘문예 공모마감은 12월 초에 몰려 있다. 원고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온몸에 긴장감이 차오르고,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 듯 뜨거워진다. 끼니를 걸러도 배고픈 줄 모르고, 한파가 밀려와도 추위를 느끼지 못한다.
그해 나는 스물세 살. 시립도서관에서 신춘문예에 응모할 원고를 준비를 했다. 마감일자가 코앞이었지만 초조함도 없고 쫓기는 기분도 아니었다. 먼 데서 누군가 찾아올 듯 기대감에 차 있었다. 시 초고가 스무 편 남짓. 비평 원고도 두 개나 있었다. 습작노트에 빽빽하게 적어놓은 문장을 원고지에 옮겨 적은 뒤 마감 당일 광화문 인근의 신문사 몇 군데를 들러서 원고봉투를 제출했다.
작품을 떠나보내고 빈손으로 돌아서는데 마음이 공허했다. 이튿날 청량리 역에서 밤기차를 타고 정선으로 갔다. 손에 들린 짐은 세면도구와 유화도구뿐. 왜 강릉이나 속초가 아니었을까. 정선에 연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무튼 정선에 내려 여관을 잡고 잠을 잤다. 느지막이 일어나 아침밥을 먹은 뒤 이젤과 작은 캔버스를 들고나가 강원 내륙의 황량한 거리 풍경을 그렸다. 거리에는 인적이 드물고 찬바람만 마른 먼지를 몰고 다녔다. 정선에서의 며칠이 꿈결 같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여량, 예미, 사북, 태백 같은 강원 내륙의 소읍을 헤매는 동안 폭설이 내렸던가? 눈이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문학이냐 생활이냐. 여행하는 내내 나는 두 개의 선택지 앞에 서 있었다. 무겁고 진지한 물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생산이 없는 방황과 맹목을 사랑하는 치기는 떨쳐야 한다는 다짐을 굳혔다. 돌아가자. 문학일랑 접고 새로 시작하자. 강원 내륙을 떠나 청량리 역사에 내려 거울에 비친 내 몰골은 부랑자와 다를 바 없었다. 꾀죄죄한 옷매무새에 유화물감이 덜 마른 캔버스를 들고 역을 빠져나오니 구세군의 종소리가 고막을 울린다. 도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세밑 거리를 메운 행인들의 발걸음은 활달하다. 기쁜 소식을 들었다. 찬란한 예감 따위는 없었다. 집에 들어서니 식구가 신문사 두 군데에서 받은 전보를 건넸다. 집에 전화가 없던 시절이라 신춘문예 당선 통보를 전보로 받았다. 얼핏 보니, 식구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했다.
새해 들어서 한 출판사에 면접을 보러 나갔다. 출판사에서 취업 기회를 준 것은 시와 문학평론에서 당선한 걸 갸륵하게 여긴 덕분이리라. 편집부 취업이 결정되자 시장에서 양복 한 벌을 사 입었다. 취업이 사회로 들어서는 입사의식(入社儀式)이라면 양복은 사회인의 제복일 테다. 첫 출근을 하는 날, 고립된 외톨이로 떠돌던 문청시절은 끝나고 사회인의 세계로 들어서는 자각이 스쳤다. 이제 방황은 사치에 지나지 않을 테다. 쓰려는 열정은 끓어올랐지만, 당분간 바위처럼 무거운 생활을 감당하며 삶에 충실히 복무하겠다, 라고 결의를 다졌다.

![우울한 생일 맞은 롯데…자산 매각·사업 재편 속도전[롯데, 위기 속 창립 58주년]](https://img.etoday.co.kr/crop/140/88/2124556.jpg)



![[살얼음판 韓 경제] ‘마의 구간’ 마주한 韓 경제…1분기 경제성장률 전운 감돌아](https://img.etoday.co.kr/crop/140/88/2155272.jpg)


![병원 외래 진료, 17분 기다려서 의사 7분 본다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140/88/2155399.jpg)



![2차전지 반등의 시작은 이때? 바닥 탈출의 신호는 '이것' ㅣ 이창환 iM증권 영업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KRXB6Qo6hyE/mqdefault.jpg)

![트럼프, 중국‧홍콩발 ‘면세한도’ 다시 폐지...쉬인‧테무 직격[미국 관세폭풍]](https://img.etoday.co.kr/crop/85/60/2138497.jpg)
![벤츠코리아, 신형 ‘AMG GT’ 상륙…맞춤 제작 ‘마누팍 투어’도 공개 [서울모빌리티쇼]](https://img.etoday.co.kr/crop/85/60/2155823.jpg)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155820.jpg)
![제네시스, ‘엑스 그란 쿠페ㆍ컨버터블’ 콘셉트 공개 [서울모빌리티쇼]](https://img.etoday.co.kr/crop/85/60/2155808.jpg)

![병원 외래 진료, 17분 기다려서 의사 7분 본다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300/170/2155399.jpg)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1558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