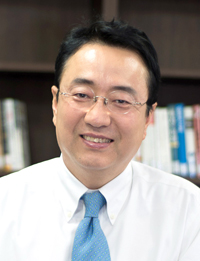
9일에도 4% 넘게 떨어져 연초 대비 30%나 폭락했는데, 이처럼 도이치뱅크가 코코본드 이자를 못 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 은행은 67억 유로의 순손실을 봤다. 존 크라이언 도이치뱅크 최고경영자(CEO)는 9일 증시 마감 후 “은행 경영상태는 바위처럼 견고하며 올해 10억 유로의 이자 지급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도이치뱅크가 수십억 유로 규모의 채권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FT가 보도하면서 미국 뉴욕증시에선 낙폭을 줄였지만 불안감을 완전히 잠재우진 못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도이치뱅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유럽 은행들은 최근 부실채권 증가와 마이너스 금리 체제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즉, 경기 악화로 인한 기업들의 디폴트가 늘어나는 한편,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짐에 따라 은행들의 예대마진이란 수익의 원천이 말라버리는 것이다.
최근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지난해 하반기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등의 105개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금이나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규모가 모두 1조 유로에 육박해 2009년 대비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9일에는 스위스 최대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가 8%까지 폭락하였고, 이탈리아 최대 은행인 유니크레디트도 7% 정도 떨어지는 등 유로존 은행 주가가 추풍낙엽처럼 추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통화정책이 얼마나 유효한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예컨대 ECB의 경우 최근 마이너스 예금 금리 동결을 발표한 후 달러화에 대해 더 강세로 돌아섰으며, 일본의 경우도 BOJ가 사상 처음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발표한 이후 오히려 급격한 엔화 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까지 동원하여 통화를 풀면 마땅히 해당 통화가 약세가 되어,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러한 통화 완화정책의 목표인데, 현실은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으니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이미 통화정책이 ‘실 끝을 잡고 미는 격(pushing on a string)’이라며 통화정책의 불능화(monetary policy impotence)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지고 보면,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은 바로 지나치게 풀린 유동성이었다.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이 주택시장의 버블을 만들었고, 이것이 월가의 금융시장을 통해 수십 배 레버리지로 증폭된 사상 초유의 거대 거품을 만들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유동성에 의한 거품이 붕괴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역사상 전무후무한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여 이를 해결하려 하였다는 점이다. 어찌되었거나 미 연준의 7년간에 걸친 사상 초유의 유동성 공급이란 비상대처가 어느 정도는 작동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유동성 공급방식이 또 작동할 것인가인데, 현재 일본 및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리 낙관적일 수가 없다. 서로 경쟁적으로 완화해가는 추세인 통화정책의 전쟁터 가운데, 미 연준도 금리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인하, 나아가서는 마이너스 금리 대열에 합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통화 완화정책이 또다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약이 아무리 좋아도 계속 쓰면 내성이 생기는 법이다.
















![송파구, 리센츠 47억·잠실엘스 46억 [올해 최고가 아파트]](https://img.etoday.co.kr/crop/85/60/2296038.jpg)


![밥상의 온기와 인간 중심 서사로 관객 사로잡은 ‘왕과 사는 남자’[리뷰]](https://img.etoday.co.kr/crop/85/60/2295902.jpg)

![[인터뷰]"해양수도 부산의 심장, 강서를 다시 세우겠습니다"](https://img.etoday.co.kr/crop/85/60/2296615.jpg)

![2월 둘째 주 유튜브 영상 순위 [이투PICK 순삭랭킹]](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78370.jpg)
!['설 연휴 귀성차량으로 막히는 고속도로'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9616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