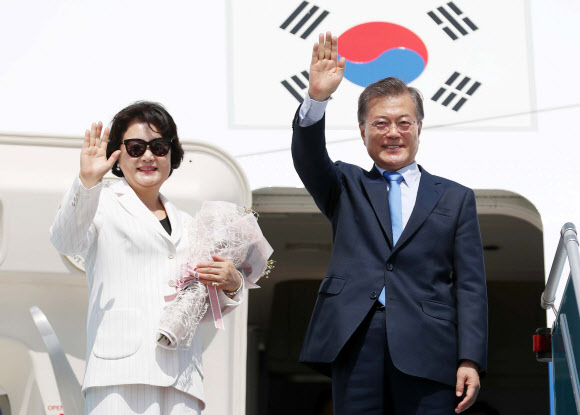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3일 “과거 두 번의 정상회담을 보면 의전·경호·행정 지원 인원을 아무리 줄여도 100명 안팎이 된다. 언론인이 50명 정도로 이를 제외하면 남는 인원은 50여 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경제계, 업종별 대표, 종교계, 문화·예술·학계, 사회단체, 여성계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되는 특별 수행원에 할당되는 인원이 50명 안팎에 그친다는 의미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특별수행원은 48명이었다.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을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청와대의 취지를 살리려면 경제인을 대거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경제계 인사를 늘리면 각계 대표들이 빠질 수밖에 없어 고민이다. 청와대가 이전 순방과는 달리 경제단체나 민간단체의 추천 없이 일부 분야별 특정 인사를 지명해 방북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규모 제한이 있어 어떤 분들을 모셔야 할지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점에서 고심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부 부처나 민간단체, 각계 대표 인사들의 민원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는 먼저 청와대 행정 지원 인원부터 최소화했다. 해외 순방 시 11~14명이었던 춘추관(기자실) 수행 인원도 이번엔 3명만 배정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만큼 방북 티오(TO, 정원)가 적어 경쟁이 치열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야당 대표 등 6명이 방북 동행 요청 거부로 티오가 늘었다고 속으로 웃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은 이번 방북에 대표단 명단에 들어가면 주식시장에서 남북경협주로 뜰 수 있어 치열한 로비전을 펼쳤다는 후문이다.

![[상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 결정…15년9개월 만에 연속 인하](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8027.jpg)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7847.jpg)
!['회복 국면' 비트코인, 12월 앞두고 10만 달러 돌파할까 [Bit코인]](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8078.jpg)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7738.jpg)
![[송석주의 컷] 순수하고 맑은 멜로드라마 ‘청설’](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8011.jpg)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140/88/2107772.jpg)





![답은 벌써 나왔다?! 내년 주도주 후보군 알려드립니다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pG4SA3nB7W0/mqdefault.jpg)









![[집땅지성] '제2의 용산' 광운대역세권 개발…10년 뒤 얼마나 오를까?](https://img.etoday.co.kr/crop/300/170/2107824.jpg)
![올해 마지막 금통위… 동결? 깜짝 인하?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1080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