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노후 안전판인 국민연금 개편이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됐다. 정부가 국회에 떠넘겼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의 제도 개선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관심조차 없다.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금 개혁이 어느 때보다 다급한데도, 정부와 국회 모두 허송세월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지금은 정부가 단일 개편안을 국회에 제안해도 실효성이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내년 6월 21대 국회가 들어야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됐던 일이다. 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편의 전제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일 수밖에 없다. 당초 복지부가 마련해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선안도 그런 방향이었다. 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5%에서 40%로 낮추면서 보험료율을 9%에서 15%까지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 45∼50%에 보험료율을 12∼13%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놓았다.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라는 주문이었는데, 국민세금으로 연금재정을 충당하지 않고는 사실상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다.
복지부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넘겼고, 경사노위는 올해 8월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는 3개 방안을 내놓았다. 다수안은 소득대체율 45%에 보험료율을 10년 동안 12%로 올리는 내용이었다. 조금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점에서 노동계도 수용했다.
하지만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수안도 연금기금 고갈 시기가 2063년으로, 지금 제도를 유지할 때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추산되는 2057년보다 겨우 6년 연장될 뿐이다. 개혁의 목적은 재정 안정성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소진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지만 효과가 미미하다. 게다가 국회는 단일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를 거부하면서 질질 끌기만 했다. 정부가 복수안을 던져 놓고 국회가 해결해줄 것을 요구한 것부터 무리였다. 여야 모두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인기 없는 개혁에 앞장서려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미뤄져서는 연금개혁이 현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연금받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보험료를 낼 젊은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경제성장률도 추락하면서 재정 기반은 약화하고, 기금운용 수익률마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앞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걷지 않고는 기금 고갈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가 여론이 두려워 연금개혁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에 더 큰 짐을 지우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정말 무책임한 행태다. 정부부터 결단을 내리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단독] "고정금리 주담대 늘리려"…은행 새 자금조달 수단 나온다[한국형 新커버드본드]①](https://img.etoday.co.kr/crop/140/88/2213721.jpg)
![인도 18곳에 깃발…K-금융, 수출입 넘어 현지화로 판 키운다 [넥스트 인디아 下-②]](https://img.etoday.co.kr/crop/140/88/2270308.jpg)
![[AI 코인패밀리 만평] 커피값 또 오르겠네](https://img.etoday.co.kr/crop/140/88/227030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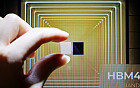
![캐즘 돌파구 대안으로…전기차 공백 메우기는 ‘한계’ [K배터리, ESS 갈림길]](https://img.etoday.co.kr/crop/140/88/2269002.jpg)





![2026년 원전 텐베거 잭팟주 후보! '이 주식'에서 노리세요! ㅣ 이영훈 iM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73yJ8EsmQdM/mqdefault.jpg)



![에그테크 코리아 2025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270532.jpg)



![오리온 ‘마라뿌린 치킨팝’‧정관장 ‘활기마이트’ 외[나왔다 신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270389.jpg)


![[케팝참참] 공식 깨진 2025년 K팝…"신인이 주인공"](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70293.jpg)
![에그테크 코리아 2025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7053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