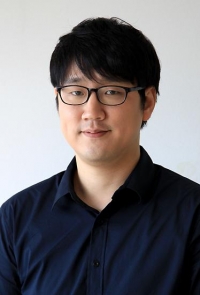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는 법. 두산 베어스는 우승 문턱까지 밟았지만 그저 문턱을 밟은 것에 만족해야 했다.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큰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팀을 가리켜 흔히 ‘아름다운 패자’, ‘우승과 다름없는 2위’라는 표현을 쓴다. 두산에게도 이 같은 위로와 격려가 쏟아진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올시즌 두산의 준우승은 단순한 2위 이상의 의미가 있다. 어떤 면에서는 삼성의 통합 3연패만큼이나 특별하다. 두산이 이겼다면 최초의 정규시즌 4위팀 우승이라는 영광이 뒤따랐을 것이다. 시리즈에서 먼저 3승을 거둔 만큼 우승 가능성도 높았다. 두산은 준플레이오프 5차전, 플레이오프 4차전, 그리고 한국시리즈를 7차전까지 치렀다. 10월 8일부터 지난 1일까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무려 16경기를 치렀다. 정규시즌이라면 적절한 체력 안배를 통해 선수들의 컨디션을 관리할 수 있지만 포스트시즌은 그렇지 않다. 매 경기 피말리는 접전으로 체력 소모는 더 크다. 여기에 두산은 경기를 거듭하며 부상자들이 속출했고 1점차 승부만 무려 7번을 치렀다. 2점차로 끝난 경기까지 범위를 넓히면 16경기 중 무려 절반이 넘는 10번이었다. 덤으로 연장 승부도 총 4번이었다.
‘후회 없는 경기’, ‘후회 없는 한판’. 틀에 박힌 표현이지만 포스트시즌에서 두산이 걸어온 행보는 혹독했다. 하지만 해피엔딩이 아니었음에도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체력 고갈과 부상자 속출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승을 목전까지 두며 삼성을 몰아붙임에 따라 삼성의 우승이 더 극적으로 부각될 수 있었다. 류중일 감독 역시 이 점을 모를 리 없다. 경기 후 “김진욱 감독은 어디에 계신가”라고 물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패자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명승부를 연출한 두산에 대해 최대한의 예의와 존경심을 나타낸 것이다. 못내 아쉬운 준우승일 수밖에 없지만 김진욱 감독 역시 “우리팀에 패자는 없다.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을 격려했다.
올시즌 한국시리즈의 승자는 삼성이지만 어떤 면에서 진정한 승자는 양팀 모두다. 두산의 준우승을 우승과 다름 없는 성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시리즈가 최종전인 7차전까지 가서 갈렸기 때문만은 아니다. 부상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투지와 정신력 그리고 부상을 안고 있음에도 팀의 승리를 위해 한 타석, 한 타석에 집중한 선수들의 의지가 팬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적장에게도 존경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명승부를 만들어낸 두산에게도 우승팀과 다름 없는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비록 중요한 순간에 주연이 아닌 조연 역할에 머물렀지만 그들은 주연 못지 않은 빛나는 조연이었다.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140/88/2294169.jpg)








!["엔비디아가 골목길 입구까지 쫓아왔다?" 자율주행 사이다 팩트 체크 [찐코노미] #테슬라](https://i.ytimg.com/vi/tIWc3d9GgOE/mqdefault.jpg)


!["미래의 반도체 될까"⋯한은, 초고령사회 '실버경제' 꺼내든 속사정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294228.jpg)

![정은경 장관, 의대 정원 연평균 668명 늘린다…내년 490명 증원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294293.jpg)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94169.jpg)
![정은경 장관, 의대 정원 연평균 668명 늘린다…내년 490명 증원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942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