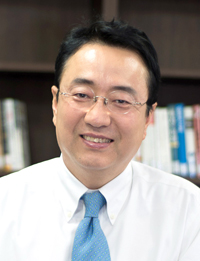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미 예고된 것이어서, 금융시장의 반응은 매우 차분하였다. 오히려 금리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우지수는 200포인트 이상 올라 1.28% 상승세로 끝났으며, 달러화도 유로화 대비 0.3% 상승한 유로당 1.0902달러를 기록, 금리 인상이라는 소재를 이미 금융시장이 충분히 소화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은 결코 그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이미 금융가에서는 “체제 변동(Regime Change)이 일어났다”, “대불확실성(Great Uncertainty)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등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자. 미국은 도대체 왜 금리를 인상한 것일까? Fed가 이번 금리 인상을 위해 주목한 경제지표는 크게 ‘고용’과 ‘물가’, 두 가지이다. 먼저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미국의 실업률은 5%를 기록, 완전고용상태로 간주되는 4.9%에 근접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참여율(Participation Rate)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66%대보다 훨씬 낮은 62.5%에 머물고 있어,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취업을 단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완전고용에 가까운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느슨함(slack)’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어 고용지표만으로는 이번 금리 인상을 정당화하기엔 부족한 느낌이다.
그 다음 ‘물가’지표를 살펴보자. 미국은 2012년 물가 목표치 2%를 설정할 때 그 목표치가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라고 정의하였다. ‘개인소비지출’이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다른 점은 CPI는 물가가 비싸지면 소비자가 다른 싼 물건으로 구매를 변경하는 행위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반면, PCE는 가구당 소비지출 금액으로 파악하므로 이러한 포괄적 가구당 체감 물가를 실시간으로 잘 반영하는 특징이 있다.
현재 미국의 PCE는 0.2%에 불과하여 Fed가 목표로 삼고 있는 2%에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물가는 유가에 기인하는 바가 커서, 유류 및 농산물 등 변동성이 큰 항목들을 제외한 ‘근원(Core) PCE’를 살펴보면 그 수치가 1.3%로 올라간다.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내년에는 1.6%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PCE 중에서도 가장 변동성이 큰 양 극단의 두 항목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평균(Trimmed Mean) PCE’를 보면 이 수치가 1.7%로 더 올라간다. 마지막으로 CPI를 살펴보면 ‘근원 CPI’가 드디어 2%를 넘어서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미 Fed는 미국의 인플레가 상승압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Fed 총재인 존 윌리엄스는 “우리는 인플레의 흰 눈동자(the whites of inflation’s eyes)를 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고 이러한 선제적 조치를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미 연준이 보유한 4.5조 달러의 주택담보채권 등 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인데, Fed의 성명서는 당분간 이들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있다.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https://img.etoday.co.kr/crop/140/88/2296074.jpg)









![[내일 날씨] 미세먼지 '나쁨' 벗어나지만…추위 컴백](https://img.etoday.co.kr/crop/85/60/2292831.jpg)


![한국 현재 순위 14위…오늘 예정된 주요 경기는? [2026 동계올림픽]](https://img.etoday.co.kr/crop/85/60/2296526.jpg)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될까…"설 이후 한 번 더 상승 여력" [찐코노미]](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96128.jpg)
![중국 춘절 연휴 시작, 북적이는 명동거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9628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