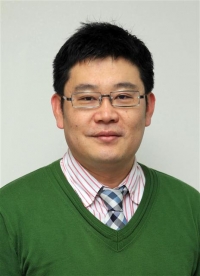
재벌닷컴이 조사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국내 30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금융회사 제외) 중 이자보상배율이 1배를 밑돌거나 영업 손실을 낸 회사 비율이 재무상황을 분석한 결과,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이거나 영업 손실을 낸 기업 비율이 33.7%를 차지했다. 대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충당하지 못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이다.
그러나 부실 계열사의 특징을 먼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부실 계열사는 상당 기간에 걸쳐 산업, 영업 환경, 경쟁 구조 등의 변화에서 나타난 결과물이다. 이는 대기업이 부실 계열사에 대해 단순한 자금과 내부거래를 통한 지원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선 시장이 무르익지 않았거나 또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해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계열사의 부실은 성장을 위한 고통일 수 있다.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실패를 기피한다. 호흡이 긴 투자를 해야 하는 사업을 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혁신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도 꺼린다. 여러 해 대기업들의 인수·합병 또는 기업 설립 업종들을 보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이 대다수이다.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과당경쟁(過當競爭)으로 지친 시장에서 경쟁업체의 점유율을 잠식하는 방법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세계 시장에서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기술력을 갖춘 좋은 기업으로는 평가받지만, 위대한 기업으로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대기업들의 투자 습성은 시장의 변화로 부실 계열사를 낳고, 투자한 금액에 대한 미련으로 정리를 하지 못해 ‘밑 뚫린 독에 물을 담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대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지 않는 부실 계열사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이미 과잉 경쟁과 시장 규모가 축소되는 오래된 사업 아이템을 가진 부실 계열사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 계륵(鷄肋)으로 닭 한 마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계란을 사서 부화하고, 다시 성계(成鷄)로 키우는 고통을 선택해야 한다. 이에 앞서 대기업들은 부실 계열사들이 계륵인지, 성장을 위한 진통을 겪고 있는 회사인지를 분명하게 진단을 해야 한다.
짐 콜린스는 저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에서 “기업 인수에 있어서 큰 규모의 인수를 통해서만 돌파하려 한 기업은 실패율이 높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스스로 축적과 돌파를 먼저 이뤄낸 경우에만 성공 확률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9일 ~ 2월 13일)](https://img.etoday.co.kr/crop/85/60/2276634.jpg)









![키키도 소환한 그 감성⋯Y2K, 왜 아직도 먹히냐면요 [솔드아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92619.jpg)
!['노란 등불 밝힌 봄의 전령사' [한컷]](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9270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