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냄새의 근원은 즉석음식 만쥬로 유명한 ‘델리스’의 부스에서였다. 델리스 부스에 설치된 즉석제빵기계에서는 쉴새없이 뻥튀기가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뻥튀기는 쌓일 틈이 없이 들려나갔다. 현장의 중국인 관람객 상당수가 이 부스에서 만들어진 과자를 들고 전시관을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농축형 한우사골곰탕을 준비한 ‘용인로컬푸드’도 바쁜 하루를 보냈다. 중국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아이템임에도 적지 않은 중국인 바이어들이 이 업체의 부스에서 시간을 보냈다. 용인로컬푸드 이종환 이사는 “예상 외로 반응이 뜨거워 우리로서도 의외였다”며 “맛과 편의성 외에도 항생제를 먹이지 않은 소를 사용했다는 점이 안전에 대한 신뢰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의 식품업체들은 주로 ‘프리미엄 마케팅’에 주안점을 줬다. 식품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진 시장여건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주된 공략 대상도 건강에 대한 소비를 아끼지 않는 중산층 이상이었다. 실제 한국전시관을 찾은 중국인 관람객들은 ‘유기농’, ‘웰빙’, ‘미용’ 등의 문구에 보다 집중하며 제품설명을 듣는 경우가 많았다고 식품업체 관계자들은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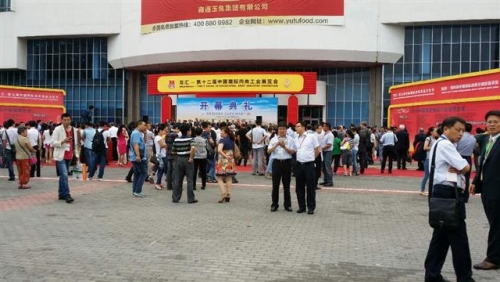
식품산업에 종사자 리우(38·남)씨는 “한국식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인식이 매우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에서도 점점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제품들의 품질이 개선되는 추세”라며 ‘안전’ 면에서 한국식품이 가진 장점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 봤다.
평소에 한국음식을 즐겨먹는다고 자신을 소개한 자이(27·여)씨는 한국식품의 가격경쟁력과 다양성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한국 식품의 가격이 높은 것은 식재료의 질 외에도 유통이나 가공과정이 많기 때문”이라며 “중국의 다양한 수요에 비해 종류가 적다는 것도 단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식품관을 함께 찾은 왕(41·남)씨와 마(37·여)씨 일행은 “중국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한국식품의 인지도가 다르다”며 “같은 베이징에서도 북쪽 지역은 한국식품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왕씨와 마씨는 중국인의 입맛에 맞는 한국음식으로 돌솥비빔밥과 삽겹살을 꼽았다.





![[단독]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IEA 장관회의 참석…韓 '대미투자' 키맨 부상](https://img.etoday.co.kr/crop/140/88/2297127.jpg)

![예금·부동산·코인서 이탈한 돈, 증시로 향했다 [머니 대이동 2026 上-①]](https://img.etoday.co.kr/crop/140/88/2296856.jpg)
![[단독] ‘1500만원’ 보안인증 컨설팅비는 최대 7억 [비용의 덫, 보안인증 의무화 역설]](https://img.etoday.co.kr/crop/140/88/2296897.jpg)














![삼성전자·SK하이닉스 90일간의 기적 [인포그래픽]](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97265.jpg)
![간판 지운 국민의힘 당사, 새 당명은 언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972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