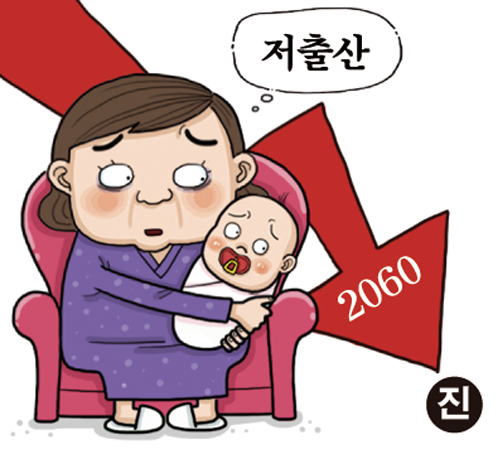
정부가 7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은 아동에 대한 차별 해소와 남녀의 평등한 일터, 은퇴세대에 대한 소득 지원으로 요약된다. 앞의 두 가지는 저출산 대책, 마지막은 고령화 대책이다. 전반적으론 출산을 장려하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골자다. 패러다임 전환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고령화 대책인 다층적 노후소득(연금) 보장체계 내실화와 중년 재취업 지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반면 저출산 대책들에 대해선 공감하는 의견을 찾기 어렵다. 무엇보다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부터 현실과 괴리됐다. 우선 이번 로드맵은 모든 부성(父姓)을 부정한다. 부모가 모두 존재하는 가정에서도 협의로 자녀의 성을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父)와 자녀의 성이 다를 때 이혼 가정의 자녀로 오인되거나, 자녀의 성을 협의하는 문제가 가정 불화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이는 제도가 아닌 관습과 문화의 문제다. 명분도 공감을 얻기 어렵다. ‘아동에 대한 차별 해소’를 이유로 모든 부성을 폐지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
둘째, 정부는 저출산을 여전히 여성의 문제로 보고 있다. 남녀 임금현황 제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여성 임원 목표제를 도입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방안도 로드맵에 포함됐다. 여기에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예방되고, 가정 내 육아 책임이 분담되면 자연스럽게 출산이 늘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저출산은 단순히 ‘여성이’ 아이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의 저출산은 비혼·만혼 추세에 기인한 면이 크다. 비혼·만혼의 배경은 성별로 다르다. 남성은 결혼비용이 가장 큰 부담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16년 발표한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하위 10% 남성의 혼인율은 6.9%(여성은 42.1%)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보건사회원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결혼시장 측면에서 살펴본 연령계층별 결혼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은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혼인율이 떨어졌다.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출산·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이 커져서다.
이런 관점에서 직장 내 성차별 해소와 여성 경력단절 예방, 육아 책임 분담은 분명 필요하지만 저출산 대책의 전부가 될 순 없다.
전반적으론 정책이 잘못됐다기보단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여전히 그들만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듯하다.
보건복지부를 출입하면서 공무원들로부터 “저출산 주무부처를 출입하면 저출산 대책에도 협조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핀잔을 종종 들었다. 그때마다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 정책에서 희망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긴 아직은 이른 것 같다.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https://img.etoday.co.kr/crop/140/88/2296074.jpg)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될까…"설 이후 한 번 더 상승 여력" [찐코노미]](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96128.jpg)
![설 연휴, 인천공항 주차장 만차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9569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