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조선업은 기술 격차로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거센 추격에 선종 개발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철강업계 또한 내수 위주 시장일지라도 철강 최대 생산국이자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조선업 수주규모의 경우 한국은 1110만 CGT, 중국(1010만 CGT)을 추월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경쟁상대이긴 하지만 주력 아이템이 달라졌다. 한국은 고부가가치 대형선이 주력이지만 중국은 가격을 무기로 다양한 크기의 선박을 수주하는 전략이라 시장이 나눠진다.
업계 관계자는 “벌크선의 경우, 중국으로 넘어갔고, 한국은 대형선박이나 LNG선 기술력 앞서고 있고, 수주 많이 하고 있고, 중국이 쫓아오려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년 동안 유럽, 일본을 거쳐 한국 중심에서 최근 들어 중국으로 넘어갈까 말까 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여기에서 중국보다 납기일을 준수하는 한국의 장점이 발휘되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가스값 치솟는 등 운송을 빨리 해야 하는 화주 입장에서 선가가 10% 정도만 중국과 차이가 나더라도 납기일에 보다 정확한 한국을 택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반면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이지만, 중국이 기술력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K-조선업이 가져야 할 특장점에 대해 “한국이 납기일을 준수하고 건조를 잘하는 것은 이제 당연하고,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줄어들 것이다. 중국이 쫓아오는 시점이 있을 것이기에 한국은 대비해야 한다”면서 “조선업 3사가 선급인증 받았다는 것을 앞세우는 것은 당장 팔아먹지 못하더라도 선주 수요에 맞춰 다양한 선종을 미리 개발해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한편 철광석의 전 세계 생산량이 연간 15억~16억 톤 정도인데, 중국은 9억~10억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는 한중 수교를 맞은 이후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좋은 파트너로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중국 시장 자체도 침체돼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전 세계 철강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나라 제품들도 동반하락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어 철강 시장 자체도 조금 숨죽이고 있는데, 계절적 성수기가 오게 되면, 다시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의 경우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계절적 침체에 따른 상황을 잘 대응하다 보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향후 고부가가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등 충분히 반등의 시기가 온다고 본다”고 말했다.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https://img.etoday.co.kr/crop/140/88/2270227.jpg)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https://img.etoday.co.kr/crop/140/88/208234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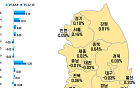




![2026년 원전 텐베거 잭팟주 후보! '이 주식'에서 노리세요! ㅣ 이영훈 iM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73yJ8EsmQdM/mqdefault.jpg)
![캐즘 돌파구 대안으로…전기차 공백 메우기는 ‘한계’ [K배터리, ESS 갈림길]](https://img.etoday.co.kr/crop/85/60/2269002.jpg)
![포드도 뛰어든 패권다툼…성장 기대 속 출혈경쟁 우려 [K배터리, ESS 갈림길]](https://img.etoday.co.kr/crop/85/60/2268943.jpg)

![진한 닭 육수의 고소한 맛 ‘꼬꼬면’⋯하얀 국물 라면 열풍 주도[K-라면 신의 한수(21)]](https://img.etoday.co.kr/crop/85/60/2270317.jpg)

![삼성 OLED TV ‘빛 반사 방지’ 기능으로 보다 선명한 화면 감상 [히트상품]](https://img.etoday.co.kr/crop/85/60/2270099.jpg)
![LG전자, '스탠바이미2'로 이동식 스크린 시장 평정 [히트상품]](https://img.etoday.co.kr/crop/85/60/2270091.jpg)
![삼성 ‘비스포크 AI 콤보’로 의류 세탁·건조 더욱 손쉽게 [히트상품]](https://img.etoday.co.kr/crop/85/60/2270095.jpg)
![[데스크 시각]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논쟁 너머의 의미](https://img.etoday.co.kr/crop/85/60/2221561.jpg)

![[케팝참참] 공식 깨진 2025년 K팝…"신인이 주인공"](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70293.jpg)
!['통일교 특검'으로 뭉친 국민의힘-개혁신당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6953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