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중국 메모리 산업
정부의 전폭적 지원… 사상 최대 반도체 투자 기금 조성

중국 반도체 산업의 놀라운 성장은 역설적으로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자생력을 키웠고,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받으며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냈다.
미국은 2019년부터 국가 안보 및 군사적 위협 등을 명분으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다. 화웨이를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올려 미국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칩 공급을 막았다. 2020년에는 TSMC와 삼성전자 등 전 세계 파운드리 기업들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화웨이는 퀄컴, 인텔, AMD 등 미국 반도체 기업의 칩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TSMC로부터 7나노미터(㎚, 1㎚ = 10억분의 1m) 이하 최첨단 공정의 반도체 생산도 불가능해졌다. 미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네덜란드 장비 업체 ASML이 중국에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수출하는 것도 금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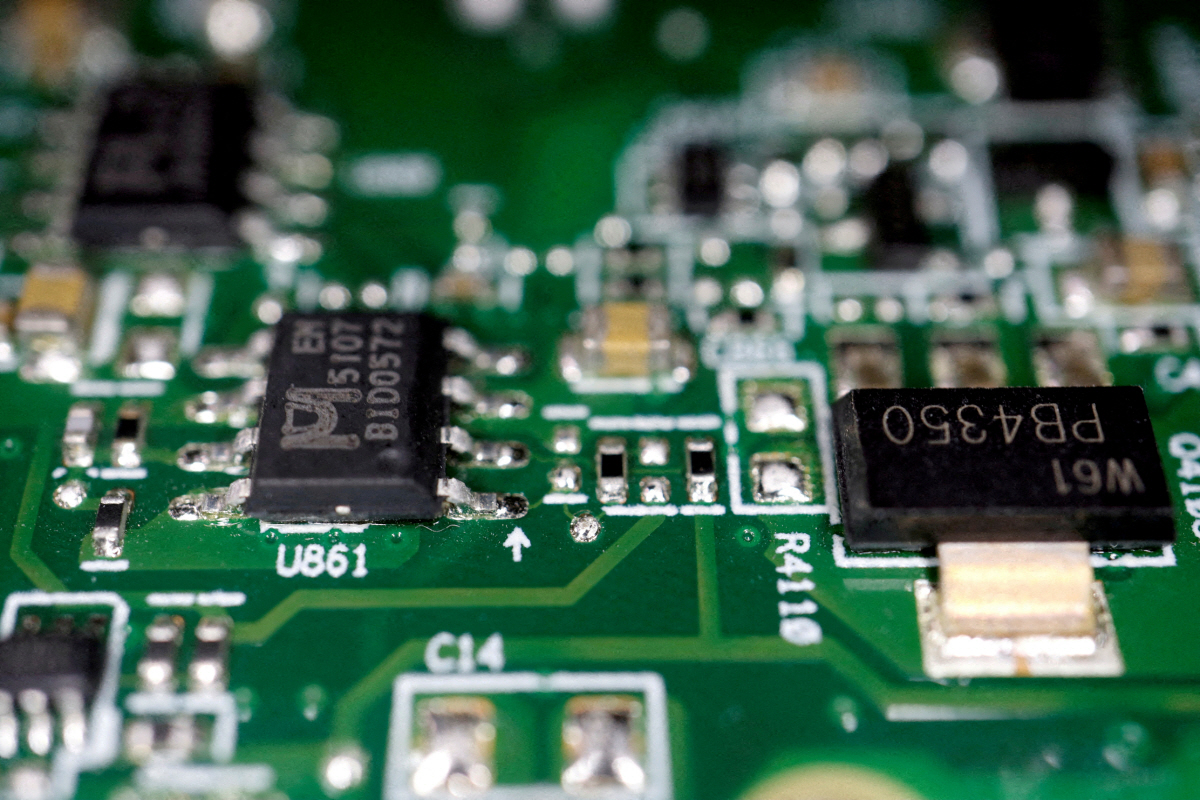
관련 뉴스
미국의 제재는 중국이 자체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화웨이의 독자 칩셋 개발이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ARM 아키텍처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자체적으로 설계한 칩셋인 '쿤펑(Kunpeng)'과 '아센(Ascend)' 시리즈를 개발했다. 이는 중국이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도 자립성을 키워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 생산 기술에서도 자립화에 나섰다. 최선단 공정에 필수적인 ASML의 EUV 장비 수출이 차단되자 자체적으로 노광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노광 장비는 반도체 기판(실리콘 웨이퍼)에 고도로 복잡한 회로 패턴을 새겨넣는 기술이다.
중국 반도체 장비 기업인 상하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MEE)는 이미 28나노 공정용 노광 장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으며, EUV 노광 장비 개발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압박할수록 오히려 중국은 기술 자립을 가속화했다”며 “화웨이가 독자적인 칩을 생산하며 살아남은 것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이끈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탄탄한 내수 시장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반도체 수요를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특히, 화웨이는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하며 반도체 수요를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화웨이의 스마트폰에는 중국 자체 개발 메모리인 창신메모리(CXMT)의 제품이 탑재되고 있다. 또 화웨이의 AP(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도 중국의 SMIC 파운드리에서 생산되고 있다. 지난해 화웨이가 출시한 스마트폰 ‘메이트60 프로’에는 SMIC의 7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기린(Kirin) 9000s’ 칩세트가 탑재되면서 업계를 놀라게 했다.

중국 반도체의 성장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후 대규모 투자 기금을 조성하며 자국 반도체 기업 지원에 나섰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440억 위안(약 64조6720억 원) 규모의 반도체 기금을 마련했다.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심대용 동아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중국 메모리의 문제는 수율(양품 비율)인데, 아직 60~70% 수준에 불과하다"며 "다만 수율이 안 나와도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이를 메우며 규모의 경제를 키워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뚫고 반도체 기술력을 빠르게 키우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 반도체의 성장에 따라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 과거에는 중국의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면 중국이 한국으로부터의 반도체 관련 부품 등의 수입이 증가했으나 이제 중국 내 공급 망이 강화되면서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中 반도체 굴기, 한국 턱밑까지 쫓아왔다”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https://img.etoday.co.kr/crop/140/88/2138033.jpg)
![소상공인 카페 매출 10% 급감 vs 스타벅스 사상 최대 실적 [소비재 시장 양극화]](https://img.etoday.co.kr/crop/140/88/2138111.jpg)
![[상보] 우크라 종전 가속화…트럼프 “아마도 이달 내 푸틴 만날 것”](https://img.etoday.co.kr/crop/140/88/2138162.jpg)
![이하늬 60억 냈는데…연예계 세무조사,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은?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140/88/2138044.jpg)



![예상치 못한 호재 터진다! / 삼성전자 스타게이트 전 세계 놀랄 큰 그림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zizaPPLuM2c/mqdefault.jpg)
![[BioS]셀트리온 "또", 1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https://img.etoday.co.kr/crop/85/60/2095168.jpg)





![“동물 보는 듯 시선, ‘말단비대증’ 환자들 두 번 울린다” [인터뷰]](https://img.etoday.co.kr/crop/85/60/2137609.jpg)
![소상공인 카페 매출 10% 급감 vs 스타벅스 사상 최대 실적 [소비재 시장 양극화]](https://img.etoday.co.kr/crop/85/60/2138111.jpg)


![이하늬 60억 냈는데…연예계 세무조사,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은?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138044.jpg)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138072.jpg)